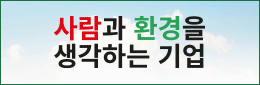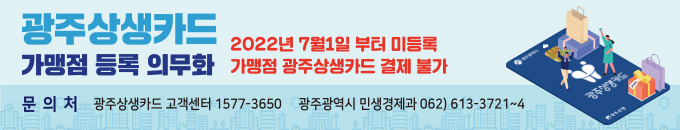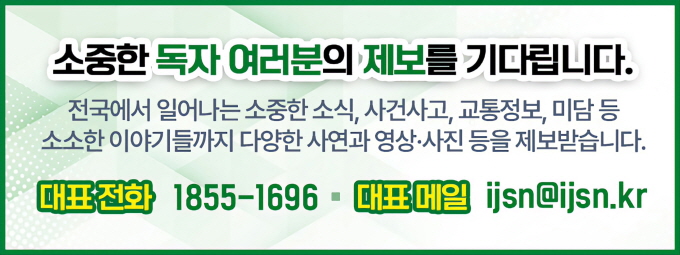[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상임이사 이연]
어머니는 담양 백동리의 부잣집 맏딸로 태어났다. 남부러울 것 없이, 고생 한번 하지 않고 곱게 자란 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6남 2녀 중 장남에게 시집을 와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결핵에 걸린 시아버지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봉양했고, 시동생들을 모두 출가시켰다. 뿐이랴. 남편은 집안일이나 경제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살았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귀하게 자란 티를 모두 벗어던지고, 소매 걷어붙인 채 꿋꿋이 가정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그야말로 철인 같았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는 날마다 닭이 울기 전, 신 새벽에 일어나 돌절구에 보리쌀을 곱게 갈아 그 많은 식구들의 밥을 지었다. ‘드르륵 드르륵’ 보리쌀 가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올 때면 나는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랬던 게 습관이 되어 지금도 새벽잠이 없다. 보리밥은 단 한 번에 지을 수 없다. 돌절구로 보리를 곱게 갈아서 삶은 후 쌀과 함께 넣고 다시 불을 때야 부드러운 보리밥이 된다. 지금 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어머니의 보리쌀 가는 소리는 다시 듣고 싶은 추억의 소리이자 선율 고운 음악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겨울이면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베를 짜셨다. 나는 베틀 아래 누운 채 철거덕철거덕 베틀소리에 맞추어 어머니에게 구구단을 배웠다. 내가 잠이 들려고 하면 어머니는 애절한 음조로 자장가를 불러주시거나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동요를 들려주셨다. 그때는 이가 많았던 시절, 게다가 나는 온통 종기투성이였다. 여기저기 긁느라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면 “어미 손은 약손, 어미 침은 명약” 하시면서 침을 발라주거나 배를 쓰다듬어주시곤 했다. 정말 그때는 어머니의 손은 약손, 어머니의 침은 명약과도 같았다.

[초등학교 학부형 시절의 어머니]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직접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다. 여름이면 마당 여러 곳에 모깃불을 피우고 담뱃잎을 밤늦도록 엮어서 비닐하우스 안에 매달았다. 담뱃잎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 따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담배 밭으로 갔다. 덕분에 여름이 지날 때쯤이면 마치 흑인처럼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렸고, 껍질이 몇 번 벗겨진 다음에야 여름이 지나가곤 했다.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담뱃잎을 말리는 일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더운 기운이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살갗을 찌르고, 땀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 단 몇 분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족히 섭씨 50~60도는 되었을 것이다. 졸려서 꾸벅꾸벅 고개를 주억거리면 어머니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해주었다. 언제나 잠이 모자란 어머니를 위해 늦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늘 어머니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담배농사를 짓는 집 아이들은 어릴 적 담배 냄새에 중독이 되어 성인이 되면 다들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나와 내 동생들은 다행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봄가을이면 누에를 쳤다. 지금은 대나무밭으로 변한 뽕밭에서 뽕잎을 땄다. 안방에 층층이 선반을 만들어 누에를 키우는데, 좁은 방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맨 밑바닥뿐이라 누운 상태에서 선반 아래로 들어가 자야 했다. 누에를 치는 방은 따뜻해야 한다. 이 때문에 봄가을에는 더워서 잠을 설칠 때가 많다. 서너 시간마다 누에에게 뽕잎을 줘야 했던 어머니는 늘 새벽잠을 설쳤다. 푹 잘 수 있는 호강을 누릴 수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나를 늘 믿어주었다.
나 역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저절로 힘이 났고,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믿음으로 연결된 모자관계였다. 그런 어머니가 내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뽕 따는 시간을 그만 놓쳐버렸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공차기가 너무 재미있어서였고, 두 번째는 가끔 우리 북초등학교와 지산초등학교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왼발잡이인 내가 레프트 윙(left wing)을 맡아서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학교까지 오셨지만, 나를 때리지는 않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불렀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시골집에 가서 “어머니” 하고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