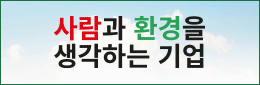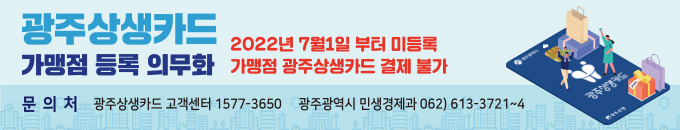[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시의원“광주천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
매년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상습 침수구역은 어김없이 재난의 현장이 된다. 도로와 지하차도가 잠기고, 주택이 무너져 내리며, 주민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흔들린다.
그러나 같은 도시 안에서도 피해 양상은 크게 다르다. 어떤 지역은 비교적 무사히 장마철을 넘기지만, 특정 지역은 매년 같은 피해를 겪는다. 재난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종종 침수 피해를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치부한다. 그러나 매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 낳은 인재(人災)다.
도시 내 침수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지리적 조건이다. 하천 주변, 저지대, 오래된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침수에 취약하다. 다른 하나는 제도와 행정의 대응이다. 취약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문제는 두 번째 요인, 즉 행정과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매년 침수 피해를 겪는 곳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공시지가가 낮고, 집값이 저렴해 취약한 입지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결국 자연환경의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이 맞물리면서, 특정 주민들에게만 재난의 부담이 전가된다.
더 큰 문제는 침수 피해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가게가 물에 잠기면 생계 수단 자체가 마비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부족하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충분치 않아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
광주시 서석고교 앞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빠짐없이 침수 피해를 겪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번 여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액이 12.25억원 이상 발생해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어 피해액이 분산 계산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의 실질적 규모보다 행정구역 단위를 우선하는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주민들은 떠날 여력이 없어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결국 장마철이 돌아오면 피해는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재난을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빈곤의 덫으로 고착화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빗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지만, 그 피해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어떤 지역은 튼튼한 기반 시설로 보호받고, 어떤 지역은 매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행정의 선택이 만든 결과다.
이제는 침수 피해를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재난 대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 복구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침수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하수관로 교체, 빗물저류시설 확충, 배수펌프장 설치에 있어 보다 더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재난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폭우는 빈번해질 것이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의 불평등한 안전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권리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특정 지역에만 보장되고 다른 지역은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않다.
침수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은 가장 취약한 곳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다. ‘물에 잠기는 동네’가 매년 반복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불평등의 그림자다.